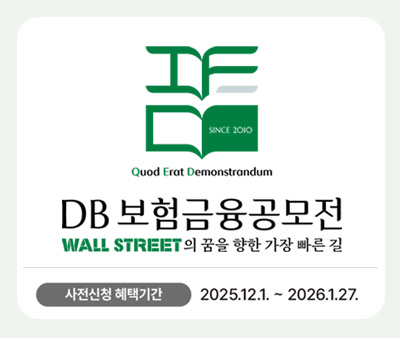[캠퍼스엔/박준 기자] 대학사회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논란은 ‘자치’이다. 학문의 성취를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돼야 할 대학은 법인 혹은 학교 장(長)에 의해 여러 차례 흔들렸다. 이에 국가가 내놓은 해답은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이다. 그러나 지금 평의원회 위상과 기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평의원회의 시작은 「사립학교법」이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의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17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국공립대 또한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평의원회는 대학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됐다. 구성원은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대학자치의 당사자가 주체로 포함됐다. 해당 기구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개방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과 달리 평의원회 위상은 전락했다. 대학본부가 평의원회 심의 및 자문을 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입맛에 따라 강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중앙대는 학문단위 구조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 과정에서 평의원회가 심의보류 의사를 표했지만 강행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학칙 제5장에 따르면 학칙개정안은 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본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다.
국공립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4월 대학연구소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38개교 중 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21개교로 55.3%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국공립대가 평의원회 도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현재 평의원회는 심의기구라는 한계에 부딪혀 그 위상을 상실하거나 도입의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학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의원회 본래 목적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등록금이 동결된 현 상황에서 대학 재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평의원회 구성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법령을 개정해 평의원회가 단순 심의기구 이상으로 격상시켜 대학본부가 평의원회 심의 및 자문을 행정전반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