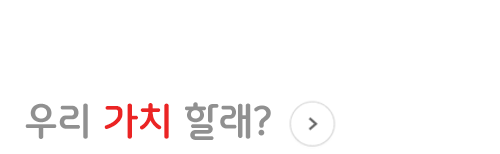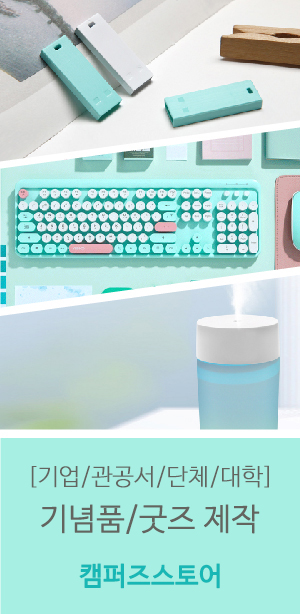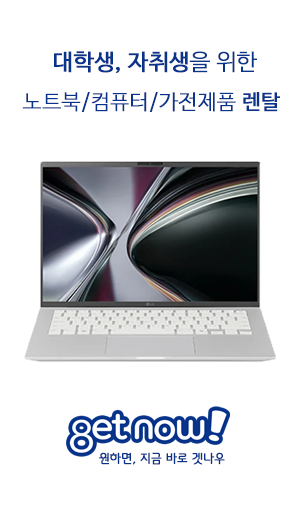[캠퍼스엔/여승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의 캠퍼스는 매우 아름답다. 신촌의 젊은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캠퍼스다. 그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 연구소를 찾아갔다. 낯선 환경에서 머쓱해 하는 나를 반갑게 반겨준 건 다문화 연구소 장한업 교수다. 그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미리 준비된 간단한 다과를 건네며 마치 푸근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화여대 다문화 연구소는 원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가 주임교수가 되고 한국인들에게도 외국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문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 중 차별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장한업 교수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문제의식 없이 쓰이는 단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두 사람이 모두 한국인이라면 ‘단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유럽에서는 주로 ‘이주배경 가정’ 혹은 ‘이민자 가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반 차별적이다.
‘장애우’라는 단어의 경우, ‘장애’라는 단어는 문제가 없지만 ‘우’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 그는 “일부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조선족’의 경우, 중국의 민족 중 하나다. 그는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중국의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에 재중동포라고 불러야 한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두고 재미동포라고 하지만 중국은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쌀국수’의 경우, 그는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는 고유 명사인 ‘스파게티’로 부르면서 베트남의 쌀국수는 고유명사인 ‘퍼’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차별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는 “선진국에 대한 사대주의 문화와 후진국에 대한 비하가 배경”이라 말했다. 차별적 단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차별적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2가지가 있다. 그는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하다. 한국의 교육은 1960년대부터 단일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민족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문화를 차별하는 근간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인 단어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는 질문에 그의 입은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차별적 단어에 다한 연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990년대 사회학자들은 정주민과 이주민의 차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장한업 교수의 경우, 2009년부터 상호문화교육을 공부하고 있다. 이는 차이의 긍정적인 접근을 다루는 학문이다.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사회활동가가 많다.
우리가 차별적인 단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장한업 교수는 “외국인이 10%가 넘으면 갈등이 본격화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8년에 외국인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 속에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교수는 이민자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외국인도 소중한 노동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국경개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세계는 국경이 있지만 흐릿하다. 이제 모든 국가는 상호의존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단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무엇보다 첫 출발점은 말로써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서적이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