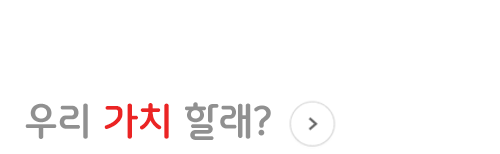[캠퍼스엔 = 박준 기자] N번방 사건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건이 분명하다.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수많은 여성을 겁박하며 반인륜적 범죄를 일삼았다. 언론은 공론화 과정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냈다. 용기 있는 PD는 거듭한 협박에도 보도를 진행했으며 각 신문사는 여론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펜촉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지난달 24일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포토라인에 오른 그의 사진은 씹기 좋은 가십거리였다.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라는 건 덤이었다. 그러나 언론이 ‘먼지 털기’ 보도를 이어가던 도중 본질은 변질했다. 사건의 중심이 착취의 대상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핸드폰 속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 유무와 언론인의 유착 관계가 1면 탑을 오르내렸다. 그러곤 언론사끼리 [단독]이라는 수식어 하나를 위해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자연스레 국민들의 관심은 사건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가해자의 한 마디가 특집 보도로 이어지고 범죄와 관련 없는 정치적 스캔들이 조명을 받는다. 점차 N번방의 피해사실은 망각한 채 잘 팔리는 헤드라인만 뽑아내는 실정이 돼버렸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했던 신상 공개는 언론에게 잘 차려진 밥상일 뿐인 것 같다.
‘내가 이거를 보도하는 게 맞나?’ 몇몇 피해자들이 피디의 이름을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본 뒤 피디가 내뱉은 말이다.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의 중대함을 되새기며, 언론은 용기 있는 보도를 시작했다. 시작을 언론이 끊었다면 마무리도 언론이 지어야 한다. 한순간도 엇나가지 않은 채.
그렇기에 달라져야 한다. 가해자 중심적 보도는 사건의 본질과 맥을 흐릴 뿐이다. 그의 약력은 어떤지, 어떤 삶을 밟아 왔는지는 현재로서 중요치 않다. N번방이라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후속 보도 속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변혁을 이룰 수 있는 보도를 진행해야 한다.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명언 중 일부다. 어둠과도 같은 터널에서 언론은 진실의 불빛을 직시하고 국민을 이끄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 진실과 한없이 가까워진 지금, 눈을 돌리지 말자.